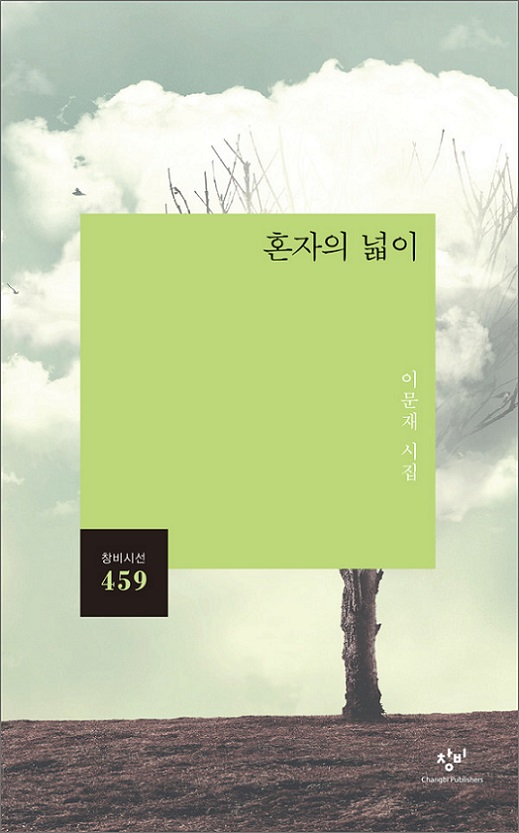당신의 바깥 - 권상진 자기가 삼킨 눈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안다 딱 그의 키만큼 울고 갔다 염장이가 그를 슬픔과 함께 단단히 묶고 눈물이 새 나가지 않도록 오동나무 관으로 경계를 두르는 동안 죽음을 빙 둘러선 사람들은 그에게 흘러든 어떤 구름에 대해 증언하거나 자신의 몸에 눈금을 그어 보이는 시늉을 했다 막잔을 비우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일어설 때 코끝까지 차오른 눈물에 그가 술잔처럼 일렁이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우리는 모두 당신의 바깥에 서 있었다 울고 있었지만 아무도 당신이 술잔에 채워 준 구름을 마시지 않았다 한 이틀 슬픔들이 속속 다녀가고 마지막 날엔 잘게 부서진 눈물이 항아리에 고였다 주목나무 아래 그를 뿌려 두고 남은 이들이 출렁거리면서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합동시집/ 시골시인-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