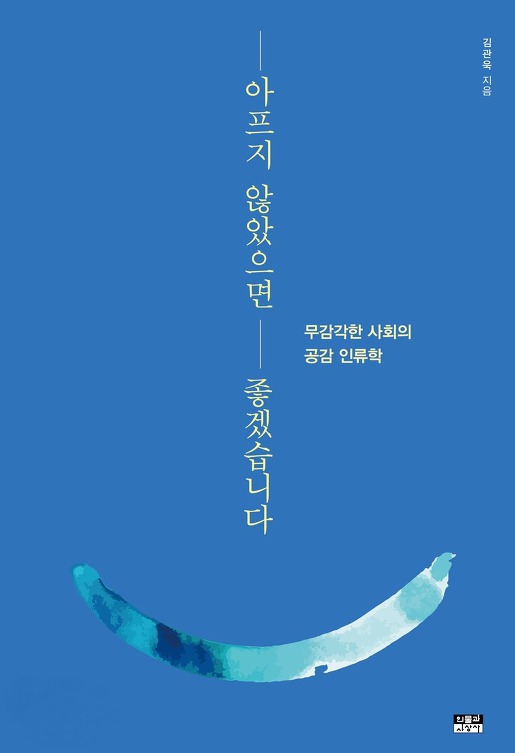
요즘 아픔을 치유하고 공감하기 위한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아마도 위로 받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인지 이런 책이 그런대로 팔리는 모양이다. 이 책은 다소 상투적인 제목에도 불구하고 홍성수의 <아픔이 칼이 될 때> 이후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이다.
겉보다 속을 까다롭게 고르기에 일단 내용물이 좋으면 닥치고 읽게 된다. 하긴 인물과사상이 내용물이 알찬 책을 출판하는 곳이기도 하다. 어쨌건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진정성이 느껴졌다. 약 팔기 위한 필자가 아닌 이픔을 공유하려는 자세가 마음에 들었다.
가족, 낙인, 재난, 노동, 중독 등 아픔을 다섯으로 분류했다. 그중 낙인의 아픔과 노동의 아픔이 인상적이다. 장애를 보는 비열한 시선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는 낙인의 장은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의 설립 과정을 적나라하게 알려준다.
예전에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장애인 학부모의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 그 학부모들은 장애인을 낳은 죄로 반대하는 사람 앞에서 죄인이 되어야 했다. 그 안에는 그 지역구 정치인의 역겨운 농간이 논쟁의 씨앗을 심었다.
특수학교가 들어설 자리는 원래 초등학교가 있었다. 그 학교가 문을 닫았다. 학생이 없어서 폐교가 되는 시골도 아니고 서울에서 학교가 없어지는 경우는 없다. 그 속에는 지역 주민들의 비열한 이기심이 담겨 있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의 병든 단면이다.
가난한 집 학생과 부잣집 학생이 함께 섞여 공부할 수 없다는 부잣집 학부모들 때문에 결국 폐교의 원인이 되었다. 폐교 자리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들어선다니 집값 떨어진다면서 결사 반대를 한다. 그 자리에는 한방병원이 들어서야 한단다.
입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운 삼겹살과 그것을 싸먹는 상추와 깻잎이 저임금 이주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에서 나온 것임을 아는가. 요즘 농촌에 가면 한국인 노동자는 찾을 수 없다. 지난 번 제주 올레길을 걸을 때도 농장엔 전부 외국인이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반문하면 할 말이 없다. 책 제목처럼 아프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세상은 어디나 그늘진 구석이 있기 마련이다. 다만 세상엔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나의 편안함은 누군가의 희생 때문이다.
나도 언젠가는 늙어 요양원에 누울 것이고 죽어 장례식장과 화장터를 사용한다. 나도 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질병으로 실명을 할 수도 있다. 요양원도 장례식장도 화장터도 장애인 시설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다.
아프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것만 아니라, 남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심지어 이 책의 저자는 담배 필 곳을 찾아 헤매는 흡연자의 고통까지도 이해하려고 한다. 욕심 부리지 않고 소박하게 사는 것도 아픔을 공감하는 일부다. 이런 책이 있어 세상은 밝다.
'네줄 冊'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라진, 버려진, 남겨진 - 구정은 (0) | 2019.08.09 |
|---|---|
| 운명이다 - 노무현 자서전 (0) | 2019.08.03 |
| 그 이름 안티고네 - 유종호 (0) | 2019.07.22 |
| 뭔가 해명해야 할 것 같은 4번 출구 - 서광일 시집 (0) | 2019.07.18 |
| 아주 특별한 해부학 수업- 허한전 (0) | 2019.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