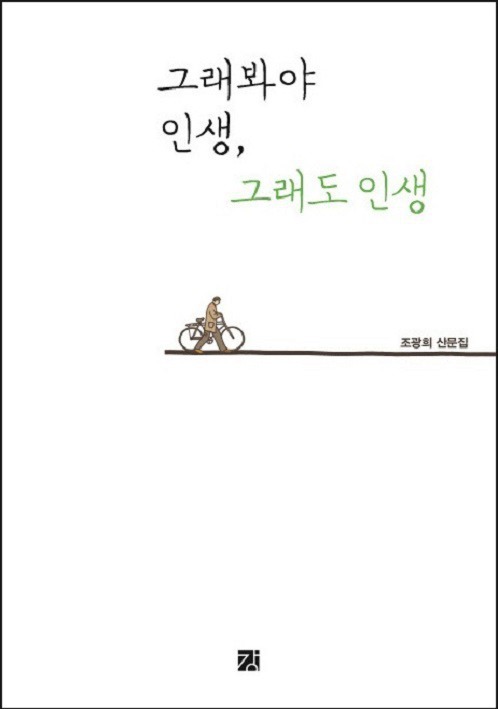
조광희 변호사의 산문집이다. 이 책을 쓴 조광희는 직업을 특정하기가 좀 애매하다. 현재는 변호사로 있으니 변호사라 호칭하는 게 맞지만 한때 그는 영화사 대표로도 있었다. 그가 영화사를 접고(망했다고 해야 더 정확하겠다) 변호사라는 근사한 직업으로 전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이다.
법률을 전공한 사람은 대체로 보수적인데다 머리가 좋아선지 권력에 줄서기를 잘한다. 유난히 발달한 출세길에 대한 예민한 촉수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데 탁월한 기능을 발휘한다. 기득권의 맛을 보기 위해 알아서 기는 능력 또한 뛰어나다.
그러나 조광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어쩌면 그도 일반적인 부류의 법학도처럼 평범한(?) 길을 걸었다면 충분히 출세하고도 남았을 거다. 스스로 권력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옳지 않은 일에 대해 저항한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캠프에서 일한 것 빼고는 대체로 그에 대한 생각을 지지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가 영화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음을 알았다. 물론 나도 조광희 변호사를 안 것은 영화에 관한 그의 글을 자주 읽으면서부터다.
그는 나와 동시대 사람이다. 내가 인천의 달동네에서 똥구멍이 찢어질까 빌빌거리며 살 때 그는 서울 상암동에서 살았다. 스무 살이 되면서 나는 그의 서식지였던 신촌에 자리를 잡았다. 행여 학창 시절 만났다면 그와는 문화적인 신분 차이로 꽤 이질감을 느끼면서 유유상종을 역행했을 것이다.
반면 정서적으로는 거의 한몸처럼 닮았다. 내 맘대로 갖다 붙인 거지만 나는 당시 시내버스를 타고 시내 구경을 하는 것이 큰 여행이었다. 버스비가 아까워 큰 마음을 먹어야 했지만 노선이 긴 버스였던 8번과 131번, 134번을 자주 탔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도 어릴 때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종점까지 멍 때리면서 시내버스 여행을 자주 했다는 대목에서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런 경험이 지금의 예술적 감각이 탁월한 조광희를 만들었지 싶다.
이 책은 흔히 보는 수필처럼 말랑말랑한 산문이 아니다. 진보적인 정치 성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세상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가가 지식인은 될 수 있으나 문화인은 쉽지 않다. 그는 문화인+지식인=교양인이라는 공식에 딱 들어 맞는다.
<그래봐야 인생, 그래도 인생>이라는 낭만적인 제목은 지금의 조광희를 있게 만든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향이다. 누군들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으랴만 유독 그에게 아버지가 영향을 많이 미쳤음은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좋은 글도 아버지가 만드는가. 좋은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자식이 나옴을 새삼 깨닫는다.
'네줄 冊'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백석 평전 - 안도현 (0) | 2018.08.08 |
|---|---|
| 내 아버지들의 자서전 - 오도엽, 이현석 (0) | 2018.08.03 |
| 이 별에서의 이별 - 양수진 (0) | 2018.07.25 |
| 존엄한 죽음 - 최철주 (0) | 2018.07.23 |
| 고기로 태어나서 - 한승태 (0) | 2018.07.19 |